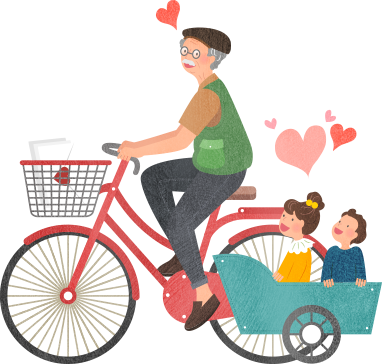2003년 2월 눈이 무척이나 많이 내렸던 어느 날, 악성림프종양을 확진을 받았다. 소아과병동 로비에 엄마와 나란히 앉아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우리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하며, 한 없이 눈물만 흘렸다.
당시 15살이었던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반장을 안 해본 적 없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의 믿음을 한 몸에 사고, 주위 여자아이들에게 인기도 사뭇 많았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던 학생이었다. 생물학자가 꿈이었던 나는 매번 과학경진대회에 학교 대표로 나가서 상을 탔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모두 내가 생물학자 꼭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나에게 어느 날 암이라는 놈이 갑자기 찾아왔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하루에 약을 수십 개씩 먹고, 머리카락은 하나둘 빠져갔다. 살은 무려 10kg이나 쪘고, 온몸에 힘은 사라졌다. 이렇게 몸상태가 변하면서 항상 자신 있고 긍정적이던 내 모습은 어디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내가 나서는 곳마다 나를 신기하게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다른 이들의 눈이 어찌나 신경 쓰이던지…. 귀에는 큰 이어폰으로 다른 이들의 소리를 막고, 동정어린 다른 사람들의 눈이 싫어 눈은 항상 아래를 향하고, 발은 큰 길 대신에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로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던 내게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아, 이대로 내가 죽으면 어떨까?’라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다. 그래서 살고 싶었다. '내가 죽으면….' 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엄습해 오는 걱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난 살고 싶었다.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암이란 놈과 싸워 이기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병원 앞에서부터 진동하는 병원냄새가 무척이나 싫었지만, 가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항암제를 맞고서 토하는 건 왠지 항암제에 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항암치료를 받는 내내 한 번도 토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항암 맞고 나서 일찍 퇴원하고 싶은 마음에, 소변에 항암제가 섞여 나오지 않으면 일찍 퇴원할 수 있다는 어떤 보호자의 말을 듣고는 항암 맞자마자 이온음료를 연신 마셔대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곤 했었다. 나는 다른 보통 아이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단지 빨리 헤어지고 싶은 암이란 원수 놈을 옆에 두고 있다는 것 외에는 말이다.
소아암이라는 놈은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주었다.
요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나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한다. 누가 보기에도 멋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시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겐 나와 같은 완치자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도 암이 나에게 왔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게로 와서 내가 큰 좌절과 절망을 헤쳐 나가고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어쩌면,
모든 게 다 소아암 덕분이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한가지 욕심이 있다면,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어서,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넌 선택받은,
특별한 아이라고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힘을 기르는 시기라고
힘든 이시기를 잘 견뎌내면,
분명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도 한때는 너희와 같았다고 말이다.
- 완치자 이야기에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연락 주세요.^^ (with@kclf.org, 02-766-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