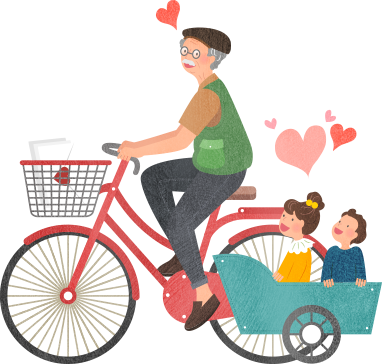2010년 10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아이는 감기, 두통으로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시력이 떨어져 걱정이라던 애 아빠의 말에 별다른 생각없이 시력 회복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간 대학병원에 서‘뇌종양’진단을 받았다.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진단결과는 현실이 되었다.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에 상황은 긴박해져만 갔다. 3시, 구급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8시간에 걸친 머리 수술 후, 바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다.
계속되는 주사, 구토, 장마비…. 6살 아이가 받기에는 너무나 힘든 치료과정이었다. 주사만 봐도 기겁하는 아이였는데…. 아이의 고통을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종양이 제발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이의 눈이 조금이나마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을 눈물과 기도로 지새웠다. 엄마와 누나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갑자기 떠나버리자, 둘째 아이는 할머니에게 홀로 남겨져 새벽이면 일어나서 울었다. 아이 아빠는 덩그마니 혼자 남겨져 집을 지켜야만 했다. 악몽같은 현실이 우리 가정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아이와 나는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 집을 알아보던 중, ‘신촌 우체국 한사랑의집’이라는 쉼터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하는 쉼터가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집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으로 마련해야하는 전세방이나 월세방보다는 훨씬 좋았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아픔을 갖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이어서였다. 쉼터에는 치료를 받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친구가 있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있었다. 친구가 없는 아이에게는 함께 놀 수 있는 언니, 동생이 있었다. 아이는 쉼터에 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했기에 치료받는 중에도 우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또 아이의 상태가 괜찮을 때는 다양한 체험 및 나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치료를 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즐거운 경험들이 아이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난 12월, 그 힘들었던 항암치료를 마쳤다.
아직 완전한 치료종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항암치료를 마친 것만으로도 한시름 돌린 듯하다. 아이는 원장선생님의 배려로 그렇게 좋아하던 유치원에, 남은 한두 달이나마 열심히 다니고 있다. 그리고 3월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슬픔과 분노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절망적이었던 뇌종양 진단, 하지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에 수술과 항암치료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며 사회공헌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서 후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아직은 살얼음을 밟듯이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아이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파이팅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가족도 그 대열에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산타할아버지, 혹(종양)을 없애는 약을 선물해 주세요.’라는 아이의 크리스마스 소원처럼 의학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여 투병 중인 우리 아이들이 부작용 없이 모두 나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 이 글은 소식지 '희망미소' 2012년 봄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