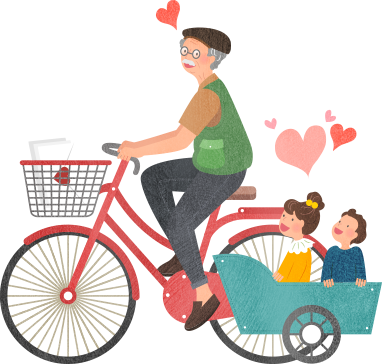2009년, 우리 경이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책가방을 메고 있는 것만 봐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에 모든 일을 스스로 잘 하는 편이라 더더욱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그런데 1학년 여름방학쯤 밤낮 없이 소변을 자주 보기 시작했다. 여름이라 음료수를 많이 마신 탓이라고 생각했다. 2학기 말쯤, 경이가 화장실을 자주 가서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병원에서 뇌하수체 이상으로 인한 요붕증으로 진단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불편하지만 약만 잘 복용하면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지냈다.
그 후 6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가 어딘지 많이 아파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기운 없이 가라앉기도 했다. 병원에 상태를 문의하니, 호르몬제 투약으로 인한 것이며 기다려보자고 했다. 그리고 5개월 후, 경이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급기야 아이는 욕을 하고, 박수를 치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신과, 신경외과를 거쳐, 혈액종양과에서 배아세포종(뇌종양의 일종) 진단을 받았다. 종양의 지름이 4.8cm 정도로 컸다. 불과 일 년만에 그렇게 크게 자라다니….
그동안 우리 경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종양 때문인지도 모르고 욕한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야단치고 훈계했던 내가, 미련하고 안일했던 내가, 죽도록 미웠다. 또 아이의 증세를 간과한 병원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커져만 갔다. 항암치료를 시작하자, 후회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엄마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위로 받았다. 완치에 대한 희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3번의 항암치료 와 양성자치료를 통해 경이의 종양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다른 암과는 달리 뇌종양은 병의 후유증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거 같다. 몸과 감정의 모든 걸 관장하는 뇌에 상처가 생겼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항암치료만 끝나면 발병 전의 경이로 되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겨울동안 경이를 지켜보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경이가 혹시 이대로 장애아로 멈춰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던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이를 참여시켰다. 처음에는 바람 쐬는 기분으로 다녔다. 15회기 정도 지나니, 경이는 월요일이면 선생님 만나러 가야한다는 걸 스스로 기억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움츠렸던 마음이 많이 밝아졌다. 자신감도 생기고 목소리도 커졌다. 물론 기억력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무엇보다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서 열린 마음으로 치료를 받는 거 같아 더 없이 흐뭇하다. 그리고 엄마인 나도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과 달라진 경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처음부터 다시 키우는 마음으로 조급해 하지 말고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 엄마의 안정적이고 평온한 정서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 같다.
지난 일 년 반을 돌아보면 길고도 혹독한 암흑의 터널을 지나온 거 같다. 그리고 이제 터널 끝의 밝은 빛이 점점 크게 다가오는 거 같다. 경이와 나는 그빛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거다.
- 이 글은 소식지 '희망미소' 2012년 가을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