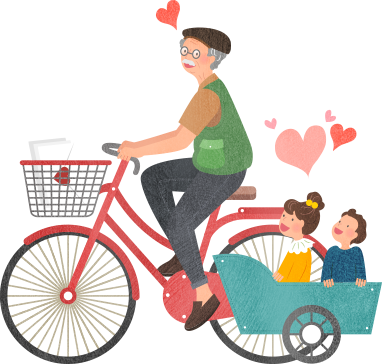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에서 매주 목요일 놀이수업을 하고 있는 22살 청년 김병훈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지 1년이 되어 가네요. 사실 저는 2010년 5월,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약 1년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몸도 좋아지고 연말이 되니 뜻 깊은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나처럼 아팠던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운좋게 바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첫 날, 저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제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 같다는 생각에 매우 들떴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치료 당시 사진을 찾아서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저를 매우 낯설어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면 대답도 안하고, 모든 것에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제 치료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와 같이 이렇게 아팠었다고 말하며 응원해주고, 궁금한 것 있으면 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도 해주며, 정말 편한 동네 이웃 형과 같은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날은 아이들 눈치만 보다가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번 놀이수업을 가기 전, 저는 아이들에게 더욱 다가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고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 즈음, “나도 너희들과 같이 아팠었어.”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진짜인지 묻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준비해 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어도 밥 잘 먹고 이겨내면 나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아픈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뒤, 아이들과 친해지고 놀이수업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힘든 치료 중에도 놀이수업을 하며 웃고 신나하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제일 뿌듯할 때는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고,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입니다. 종종 청소년 아이들과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서로 이야기하며 동네 형과 같이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마치고 쉼터를 떠날 때는 헤어짐이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고 왔어?”, “밥맛 없어도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나처럼 금방 건강해져.”,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꼭 먹어!”, “아픈 건 우리의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힘내자!”라는 말들입니다. 저의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원봉사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치료에 지쳐 힘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소식지 '희망미소' 2013년 겨울호에 실렸습니다.